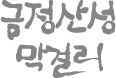민속주제1호산성막걸리 (부산일보 2006.2.9)
관련링크
본문
'귀밝이술'이라는 게 있다.
정월대보름(올해는 2월12일) 아침이면 남녀노소 상하귀천을 따지지 않고 요놈을 마셨다.
요놈은 마법의 술이다.
입에 살짝 대면 귀를 씻어줘,귀가 밝아지고,일년 내내 좋은 소식만 듣게 해준다니 말이다.
요즘 젊은이들은 영어가 술술 들리는 신통방통한 마법의 힘이 있다며 귀밝이술을 찾는단다.
귀를 밝히는 부산의 술을 찾아 술 익는 마을로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나라 민속주 1호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산성막걸리. 금성동 동사무소 앞에 있는 (유)금정산성토산주가 산성막걸리를 빚는 술도가다.
집집마다 사랑방 아랫목엔 술단지가 하나씩은 있었다는 술익는 마을 주민들이 주주로 참여해 만든 회사다.
술도가엔 누룩과 고두밥이 섞여 술 익는 냄새가 코를 찌른다.
유청길(50)사장이 철철 넘치게 따라준 도수 8도의 산성막걸리엔 누룩내가 다른 막걸리보다 유난히 진하다.
"발효균을 이용해서 하루이틀 만에 만들어내는 막걸리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유 사장의 자부심처럼 산성막걸리는 지독스레 전통적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유 사장의 어머니인 전남선(75) 할머니의 누룩빚기도 그 중 하나. 50년 세월을 하루같이 누룩방에 켜켜이 짚과 대발을 쌓아 바람길을 만들고,연탄불로 화력을 조절하면서 누룩을 빚어온 경험은 쉽게 흉내낼 수 없단다.
누룩방에서 제대로 노란꽃(누룩곰팡이)이 핀 누룩 80㎏,160㎏의 쌀로 지은 고두밥,250m 지하에서 끌어올린 금정산 맑은 물이 더해져 하루 100말의 산성막걸리가 만들어진다.
효모가 활발히 움직이면서 한창 발효 중인 술독에는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게 마치 활화산 분화구를 보는 듯 장관이다.
그렇게 인간과 자연이 함께 빚었다.
산성막걸리의 명성은 오래전부터 자자했다.
18세기초 금정산성 축성에 동원된 백성들의 갈증과 허기를 달래는 새참거리로 산성막걸리가 인기를 끌었고,그들의 입소문에 전국적 명성을 얻었단다.
일제강점기엔 산성마을에서 누룩을 빚는 양에 따라 동래시장 일대의 쌀값이 좌지우지됐다는 풍문이 나돌기도 했단다.
산성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빚은 누룩을 팔아 자식들 학교며,시집 장가를 보냈다.
유 사장의 회고담. "어머니는 장날이면 누룩 30장 40㎏을 머리에 이고 철길을 따라 물금장 양산장 진해장으로 걸어다니셨죠."마을 사람들의 생계수단이던 산성막걸리도 서슬 퍼런 밀주단속의 손길을 벗어날 수 없었다.
30년 전만해도 술도가 주인과 함께 단속반이 느닷없이 들이닥치면 마을 사람들은 술단지며 누룩을 숨기느라 정신이 없었다.
마을 입구에 달린 종이 울리면 마을 사람들의 손길이 바빠졌다.
나뭇단이나 보리짚단,아궁이 속은 물론이고 땅굴을 파고 누룩을 숨겼지만 단속반의 코를 피할 수 없었다.
엉겁결에 돼지죽통에 남은 술을 부어버리기도 했다.
술 취해 비틀거리는 돼지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
군수사령관 시절 산성막걸리 맛에 취했던 박정희 전대통령의 지시로 민속주 1호로 지정되면서 산성막걸리는 오랜 밀주단속의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밀주단속에 걸려 경제사범으로 '별'을 몇 개 씩 달고서야 술익는 마을의 명맥을 이을 수 있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09-10-22 10:17:01 관련기사에서 이동 됨]
정월대보름(올해는 2월12일) 아침이면 남녀노소 상하귀천을 따지지 않고 요놈을 마셨다.
요놈은 마법의 술이다.
입에 살짝 대면 귀를 씻어줘,귀가 밝아지고,일년 내내 좋은 소식만 듣게 해준다니 말이다.
요즘 젊은이들은 영어가 술술 들리는 신통방통한 마법의 힘이 있다며 귀밝이술을 찾는단다.
귀를 밝히는 부산의 술을 찾아 술 익는 마을로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나라 민속주 1호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산성막걸리. 금성동 동사무소 앞에 있는 (유)금정산성토산주가 산성막걸리를 빚는 술도가다.
집집마다 사랑방 아랫목엔 술단지가 하나씩은 있었다는 술익는 마을 주민들이 주주로 참여해 만든 회사다.
술도가엔 누룩과 고두밥이 섞여 술 익는 냄새가 코를 찌른다.
유청길(50)사장이 철철 넘치게 따라준 도수 8도의 산성막걸리엔 누룩내가 다른 막걸리보다 유난히 진하다.
"발효균을 이용해서 하루이틀 만에 만들어내는 막걸리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유 사장의 자부심처럼 산성막걸리는 지독스레 전통적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유 사장의 어머니인 전남선(75) 할머니의 누룩빚기도 그 중 하나. 50년 세월을 하루같이 누룩방에 켜켜이 짚과 대발을 쌓아 바람길을 만들고,연탄불로 화력을 조절하면서 누룩을 빚어온 경험은 쉽게 흉내낼 수 없단다.
누룩방에서 제대로 노란꽃(누룩곰팡이)이 핀 누룩 80㎏,160㎏의 쌀로 지은 고두밥,250m 지하에서 끌어올린 금정산 맑은 물이 더해져 하루 100말의 산성막걸리가 만들어진다.
효모가 활발히 움직이면서 한창 발효 중인 술독에는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게 마치 활화산 분화구를 보는 듯 장관이다.
그렇게 인간과 자연이 함께 빚었다.
산성막걸리의 명성은 오래전부터 자자했다.
18세기초 금정산성 축성에 동원된 백성들의 갈증과 허기를 달래는 새참거리로 산성막걸리가 인기를 끌었고,그들의 입소문에 전국적 명성을 얻었단다.
일제강점기엔 산성마을에서 누룩을 빚는 양에 따라 동래시장 일대의 쌀값이 좌지우지됐다는 풍문이 나돌기도 했단다.
산성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빚은 누룩을 팔아 자식들 학교며,시집 장가를 보냈다.
유 사장의 회고담. "어머니는 장날이면 누룩 30장 40㎏을 머리에 이고 철길을 따라 물금장 양산장 진해장으로 걸어다니셨죠."마을 사람들의 생계수단이던 산성막걸리도 서슬 퍼런 밀주단속의 손길을 벗어날 수 없었다.
30년 전만해도 술도가 주인과 함께 단속반이 느닷없이 들이닥치면 마을 사람들은 술단지며 누룩을 숨기느라 정신이 없었다.
마을 입구에 달린 종이 울리면 마을 사람들의 손길이 바빠졌다.
나뭇단이나 보리짚단,아궁이 속은 물론이고 땅굴을 파고 누룩을 숨겼지만 단속반의 코를 피할 수 없었다.
엉겁결에 돼지죽통에 남은 술을 부어버리기도 했다.
술 취해 비틀거리는 돼지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
군수사령관 시절 산성막걸리 맛에 취했던 박정희 전대통령의 지시로 민속주 1호로 지정되면서 산성막걸리는 오랜 밀주단속의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밀주단속에 걸려 경제사범으로 '별'을 몇 개 씩 달고서야 술익는 마을의 명맥을 이을 수 있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09-10-22 10:17:01 관련기사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712-09-000738-0
1712-09-000738-0